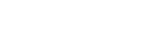급한 불만 끈 미중휴전에 기업들 '새우 등 터질 위험' 여전
트럼프 "10점 만점에 12점" 자평에도 기저갈등 해결 안돼
관세·희토류·반도체·수출통제 모두 일부 시행유예에 그쳐
"미중관계 펀더멘털 불변…가장 복합적 경쟁적 관계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무역휴전'에 들어갔으나 기업들에는 현실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관계 기저에 깔린 갈등들이 실제로는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통상악재가 계속 돌출할 가능성이 큰 까닭에 초강대국 사이에 낀 기업의 고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담판해 '무역휴전'을 한 후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기업들에 현실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일단 이번 무역휴전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가 조금 낮춰지긴 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산 상품들에 덧붙였던 추가관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른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1기에 이어 2기에 부과한 관세가 계속 누적된 까닭에 미미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많은 중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낮아지는 데 그친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산 상품의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런 행태는 관성으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가장 난감한 문제는 양대 초강대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옮기는 다년간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중간에 붙들린 기업에 미중합의에 따른 평화는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는 밀워키 소재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WSJ에 "많은 기업이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든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은 이번 미중합의 때문에 기존 생존전략을 바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판매 상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선임부사장인 조지 소프는 올해 들어 관세 탓에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프 선임부사장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협박을 실행하지 않고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깎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국 이외의 나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침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장 건립 후보지로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생산을 모두 한 나라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벨기에 국적자이며 베트남에서 어린이용 가구 제조 사업을 하는 미셸 베르치는 중국 아닌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찾는 미국 고객들을 최근 1년간 많이 봤다며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던 고객들은 이미 그렇게 했고 (이번 미중 무역휴전을 계기로)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 통제와 미국 기술이 쓰인 반도체의 수출 통제를 둘러싼 충돌도 양국 지도자간 담판으로 양측이 잠시 물러섰을 뿐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AI)이나 양자컴퓨팅 등 최신 기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을 무기화해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0월 9일에 발표했던 매우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절차는 그대로 유지해 통제 수위를 언제라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체들이 중국산 희토류 금속이나 이를 포함한 자석을 수입하려면 여러 주가 걸리는 절차를 거쳐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허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허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공급망에서 지연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
반대편에서 미국이 중국의 산업을 옥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올해 9월 말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50% 이상 지분을 지닌 자회사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중 담판을 계기로 이 규정의 시행을 일단 1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며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틀이 형성된 셈이다.
AI용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중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할지 여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이 문제를 중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숨통을 트기 위해 반도체 타협을 검토하지만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경쟁의 필수요소인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넘기는 게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미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합의가 결국 계속될 분쟁 속에 숨고르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시아에서 오래 일한 전직 외교관이며 지금은 컨설팅 업체 '아시아 그룹'의 파트너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에 "미중관계의 펀더멘털들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